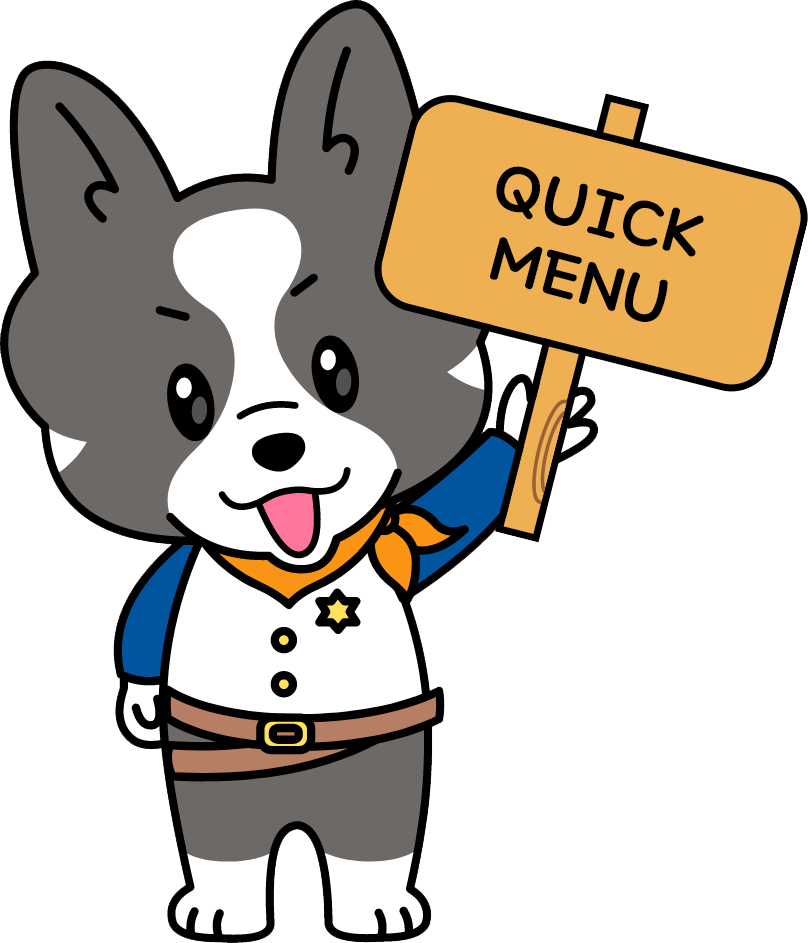줌 인 컬처
장애를 연기하는 ‘크리핑 업’
왜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 배우가 맡는 걸까?
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문화콘텐츠학 박사
비장애인이 장애인 역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런 연기를 ‘크리핑 업’(Cripping up)이라고 부르곤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백인에게 흑인 연기를 시키지 않고, 남성에게 여성 연기를 시키지 않으면서 왜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 연기를 잘 해내면 찬사를 보내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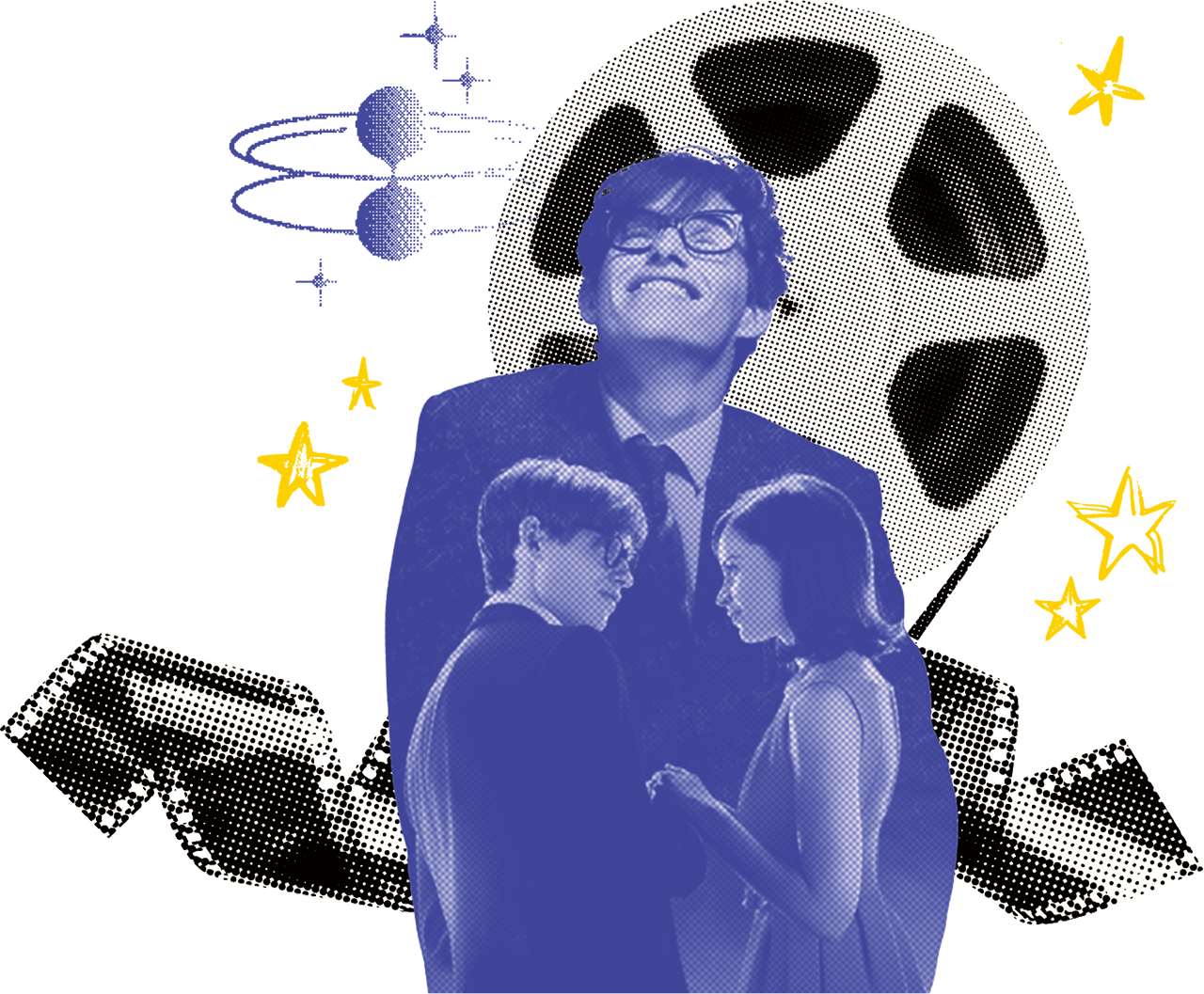
-
장애를 연기하다
-
2015년 에디 레드메인(Eddie Redmayne)은 영화 ‘모든 것에 대한 이론’(The Theory of Everything)에서 스티븐 호킹 역을 연기해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는데 이때 영국의 가디언지는 크리핑 업(cripping up) 관점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다. “에디 레드메인은 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한 비장애 배우 가운데 가장 최근 인물로 말 그대로 장애를 연기했기에 상을 받고 떠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디언지는 “‘나의 왼발’(My Left Foot)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Daniel Day Lewis)부터 영화 ‘레인맨’(Rain Man)의 더스틴 호프만(Dustin Hoffman)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연기하는 능력은 배우에게 확실한 자산이자, 진정한 호평의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을 흉내 내는 능력이 있을수록 호평을 받고 영화제에서 수상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한 대목이다. 실제로 영화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역할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을뿐더러 영화제 수상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2001년 배우 겸 영화제작자 존 로슨(John Lawson)이 언급했듯 아카데미 역사 93년 동안 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의 아카데미상 후보는 61명이었고 후보 가운데 27명이 오스카상을 받았는데 이 27명의 배우에서 장애인은 단 2명뿐이었다. 장애인 배우가 상을 받은 사례는 1986년 말리 매틀린(Marlee Matlin)이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 역할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2년 영화 ‘코다’로 트로이 코처가 청각장애 남자 배우로서는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다만, 영화계에서 크리핑 업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트로이 코처가 연기상을 받기는 했지만, 주연상은 아니었으니 1986년보다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다.
-
장애가 아닌 흥행에 맞춰지는 초점
-
-
여기에서 주안점에 두는 크리핑 업(Cripping up)은 드레스 업(Dress up)에서 왔다. 드레스 업은 보기 좋게 또는 자신과 달리 보이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크리핑 업은 장애로 보기 좋거나 달라 보이게 꾸미는 연기를 말한다. 이렇게 비장애인 연기자가 장애인 연기를 흉내 내는 크리핑 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배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그들을 연기로 공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장애인 배우의 장애 연기를 금할 수는 없다. 나름의 긍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에서 배우 문소리가 뇌성마비 장애인 역을 맡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연기자상을 받기에 이른다. 뇌성마비 장애인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한 예도 없었고, 그런 캐릭터의 연기에 나서는 배우도 없는 터에 문소리의 출연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흉내 낸 연기 때문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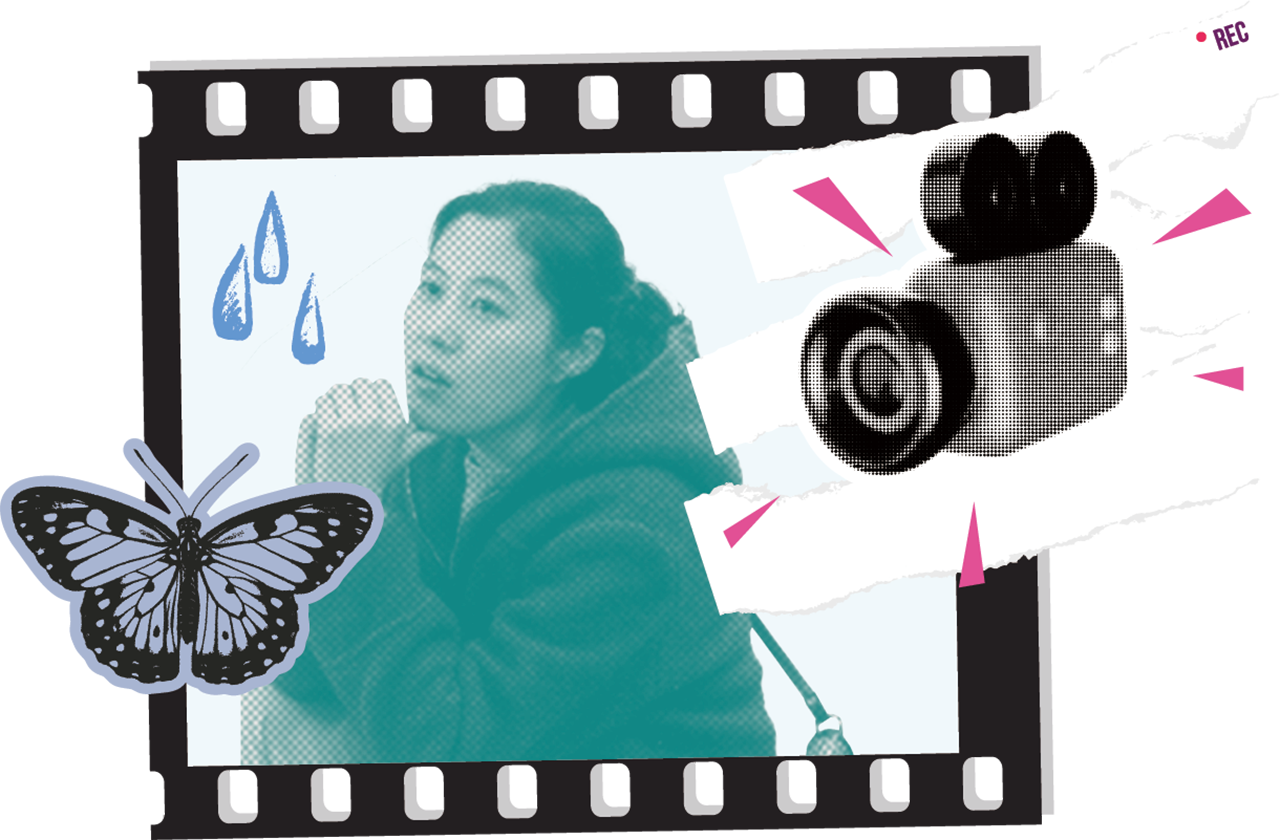
크게 호평을 하면서 상을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었다. 홀로코스트를 다뤘다는 이유로 상을 준 것과 같이 장애인 연기나 캐릭터 등장으로 상을 받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더구나 뇌성마비 장애인 같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연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 나아가 정당화하는 연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영화 ‘말아톤’에서 배우 조승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청소년을 연기했고, 해당 작품이 크게 대중적인 흥행을 하는 바람에 장애 인식개선에 이바지한 면이 있다. 하지만 조승우가 연기한 초원이 캐릭터가 남성 장애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해서 영화는 물론 드라마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마치 1969년 영화 ‘팔도 사나이’ 속 전라도 조폭 용팔이(박노식) 캐릭터가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배우가 장애인 연기에 나서는 것이 뛰어난 능력은 물론 사회적 의식이 높은 것으로 치부하게 했다. 장애 설정은 제작자들에게 인기 배우를 통해 흥행을 더 우선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작품에 맞는 장애인 배우를 찾는 노력을 하거나 오디션을 했는지 알려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런 때문에 장애인 배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있어도 활동을 이어가기도 힘들어졌다.
-
-
-
여기에서 주안점에 두는 크리핑 업(Cripping up)은 드레스 업(Dress up)에서 왔다. 드레스 업은 보기 좋게 또는 자신과 달리 보이게 꾸미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크리핑 업은 장애로 보기 좋거나 달라 보이게 꾸미는 연기를 말한다. 이렇게 비장애인 연기자가 장애인 연기를 흉내 내는 크리핑 업에 대해서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배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파악하고, 그들을 연기로 공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장애인 배우의 장애 연기를 금할 수는 없다. 나름의 긍정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에서 배우 문소리가 뇌성마비 장애인 역을 맡아 베니스 영화제에서 신인 연기자상을 받기에 이른다. 뇌성마비 장애인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한 예도 없었고, 그런 캐릭터의 연기에 나서는 배우도 없는 터에 문소리의 출연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흉내 낸 연기 때문에 크게 호평을 하면서 상을 줘야 하는지는 의문이었다. 홀로코스트를 다뤘다는 이유로 상을 준 것과 같이 장애인 연기나 캐릭터 등장으로 상을 받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더구나 뇌성마비 장애인 같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연기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영화에서는 비장애인의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 나아가 정당화하는 연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영화 ‘말아톤’에서 배우 조승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청소년을 연기했고, 해당 작품이 크게 대중적인 흥행을 하는 바람에 장애 인식개선에 이바지한 면이 있다. 하지만 조승우가 연기한 초원이 캐릭터가 남성 장애인의 표준이 되다시피 해서 영화는 물론 드라마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다. 마치 1969년 영화 ‘팔도 사나이’ 속 전라도 조폭 용팔이(박노식) 캐릭터가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배우가 장애인 연기에 나서는 것이 뛰어난 능력은 물론 사회적 의식이 높은 것으로 치부하게 했다. 장애 설정은 제작자들에게 인기 배우를 통해 흥행을 더 우선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무엇보다 작품에 맞는 장애인 배우를 찾는 노력을 하거나 오디션을 했는지 알려진 사례는 거의 없다. 이런 때문에 장애인 배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있어도 활동을 이어가기도 힘들어졌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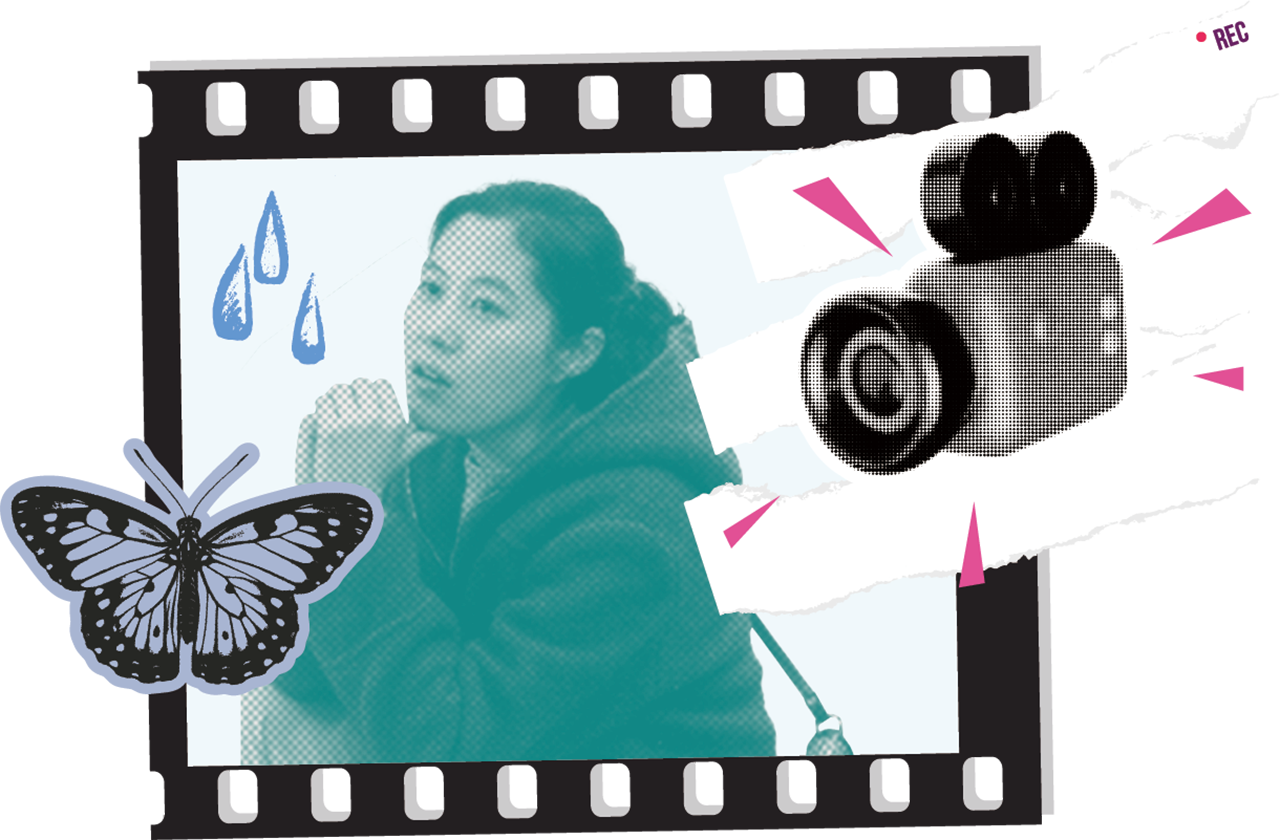
-
-
비장애인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때
-
결국, 비장애인 중심주의 관점 즉 ‘에이블리즘’(Ableism)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절단장애인 극작가 크리스토퍼 신(Christopher Shinn)은 가디언지에 “대중문화는 장애를 실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기보다는 비유로 보는 장애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이나 일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짜 장애인 배우의 연기에 관심이 없는 셈이다. 이를 극단적으로 영감 포르노(Inspiration porn) 현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만약 백인 배우가 흑인을 연기한다면 비난이 있을 만해졌지만, 비장애인 배우가 장애인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거나 인권 차원에서 둔감하다. 아시아인, 아니 한국인을 백인이 한다면 우리는 가만있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크게 인기를 끌었을 때 여전히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크리핑 업 때문이었다.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다시 등장할 때 장애인 배우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크리핑 업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는 두 명의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했는데, 한 명은 다운증후군 장애인 역을 발달장애인 정은혜, 청각장애인 별이를 농인 배우 이소별이 맡아 열연을 했다. 다만, 주연급은 아니고 에피소드에 잠깐 등장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장애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서 일관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등장시키는 제작 현장의 변화다. 장애인이 실제 출연을 하면 자신들이 불편하기에 크리핑 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배우의 활동은 결국, 제작 현장이 무장애 환경을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비장애인 작가가 쓴 작품이나 연출가의 디렉팅에 따라 장애 배우가 협업할 때는 서로 간에 충분히 대화와 숙의가 필요하다. 당장에 영화나 드라마에 지원이 이뤄질 때 한 명 이상의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나마 장애인 배우의 자아실현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