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컬처
드라마가 던진 작은 파동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글. 차미경 / 문화칼럼니스트
정신장애인에게 덧씌워진 편견 가득한 시선에 반기를 든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질환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며, 동시에 정신질환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사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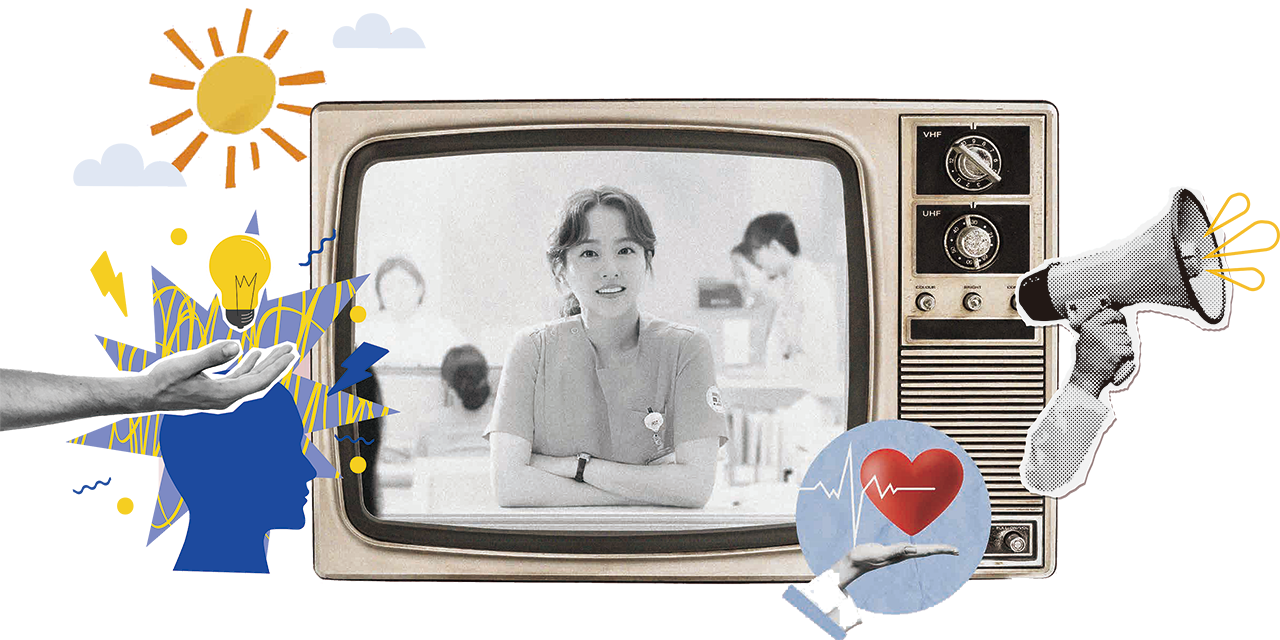
-
현실에 만연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슬로건이 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나는 정신장애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었던 최후의 장애인이었다. 정신과 질병 코드인 F코드가 기록된 진단 이력만으로도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잔혹한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편견 가득한 세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최대한 자신을 숨긴 채 살아야만 했다. 그뿐인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괴물처럼 그려지거나 심지어 정신병원은 치료의 공간이 아니라 공포물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 이젠 정신장애인도 당당히 당사자성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열정적인 목소리 덕에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 이런 현실에 당당히 정신병동을 앞세우며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바꾸는 작은 파동을 일으킨 드라마가 있다. 바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다.
-
정신질환에 이해를 돕는 시각효과와 설정
-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정신과 병동으로 처음 온 정다은(박보영 粉) 간호사를 통해 만나는 다양한 정신질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정신과 병동이 처음인 그의 시선을 따라 시청자도 낯선 정신과 병동에 익숙하게 적응해 가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설정이다. 자해의 위험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도 세심히 주의해야 하는 정신과 병동이라는 공간. 가령, 끈이 있는 운동화나 명찰은 착용하지 않고 명찰 끈은 클립으로 대신한다는 사실, 그리고 커튼도 없고 문틈에 경첩도 없으며 샤워기도 줄이 없는 고정형이라는 사실을 시청자들은 정다은 간호사의 첫 출근을 통해서 함께 배운다.
-
이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정신질환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들어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낯설지 않다고 해서 잘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저 막연히 추측만 할 뿐, 잘 알지 못하던 이 질환들에 대해 드라마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와 그래픽을 활용한 은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구현해 낸다. 차오르는 물속에서 익사해 버릴 것 같은 공황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라든지, 땅이 꺼지며 늪처럼 온몸을 끌어당기는 듯한 무기력은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금세 동화되어 버릴 것 같은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런 공포와 무기력에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정신력으로 왜 못 이기냐’며 ‘나약한 핑계’라고 함부로 말해 온 것은 아닐까.
-

-
-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
-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과도한 업무와 책임감으로 아픈 송유찬(공황장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 오리나(양극성장애), 직장 상사의 정서적 학대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회사에만 가면 불안을 겪게 된 회사원 김성식(사회불안장애), 7급 공시생으로 매번 아깝게 시험에 낙방하면서 게임 속으로 도망친 김서완(망상장애), 자신은 돌보지 않은 채 일과 육아에만 매진하다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워킹맘 권주영(가성치매), 그리고 온 마음을 쏟았던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 무기력에 빠진 정다은 간호사(우울증)까지. 그 누구도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없다. 언제든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모두 나일 수 있고 우리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한 번쯤은 누구나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차마 일을 거절하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적은 얼마나 여러 번이며, 취직이든 시험이든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했던가. 게다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잃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상실들. 살면서 그런 일들에 마음이 베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 순간들에 ‘모자라다’, ‘부족하다’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되는 말을 스스로한테 하면서(드라마 속 대사)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상처를 냈던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든 아플 수 있다고, 아플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 드라마는 다정하게 짚어주고 다독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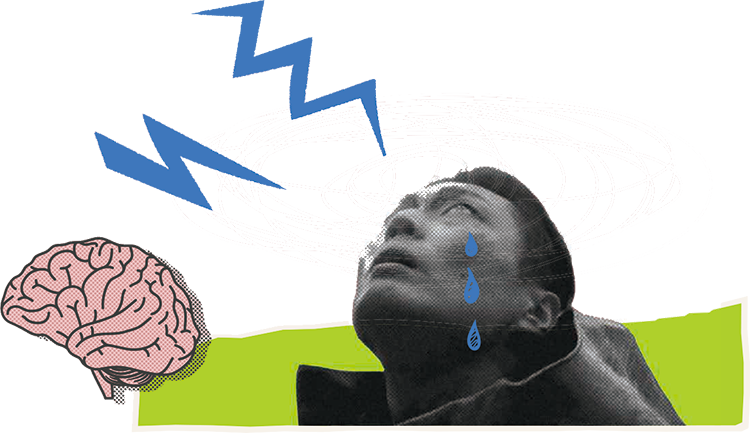
-
연약하지만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때로는 슬프게도 때로는 아프게도 때로는 병들게도 한다. 그렇지만 때로는 스스로 변하기 위해 던진 돌이 파동이 되어 자기뿐만 아니라 건너편의 누군가에게 닿기도 한다.”
드라마 속 이 대사처럼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다. 누군가의 영향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나 역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변하게 하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리고 연약하지만 또 서로 기대고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든 드라마. 이 드라마가 만들어낸 작은 파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사는 누군가의 아침을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